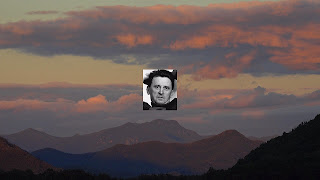영화감상 신청방법: 아래의 소개(10편)를 살피신 후 영화명, 성함을 eungsu_k@daum.net 로 보내주시면 2일 내로 파일을 전송해드립니다. 감상료는 편당 1만원이상입니다. 참고로 2019년 이전의 영화는 인디플러그, Voda(보다), 여타 OTT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낙서가 박힌 정경scene with doodles>
68분/hd/16:9/흑백 컬러 혼용/2025년/장르 없음
시놉시스
폭염을 피해 고산 지대로 휴가를 온 K는 인터넷에서 본 절경과 전혀 다른 풍경에 크게 실망한다. 지루한 시간을 보내던 그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때우다, 우연히 호텔 방에서 낯선 현지 여인을 마주한다. K는 그녀를 위한 사진을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무심코 시작했던 촬영이 점차 몰입으로 바뀌어간다.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풍경은 점차 낯설고도 신비한 이미지로 전환되고, 그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원래 세계에 매혹되기 시작한다. 현실의 기대와 괴리된 장소에서 새로움을 발견해 가는 K의 여정, 이는 세상을 대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목적이 아니라 감각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자신도 모르는 진짜 목적으로 조용히 이어진다.
제작노트(만들고 싶었던 영화)
영화의 목적이 꼭 정해 놓은 특정한 무엇이 아니라는 것,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럭비 공 같은 우연과 파격을 감지하는 것, 그 태도가 자신도 모르는 낯선 목적지로 영화를 이끈다는 것, 그것을 실험했다. 그리고 그 실험은 한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리뷰(DMZ 영화제에서 인용)
낙서의 조건은 미완과 모호함이다. 글자를 빠뜨리고 쓴 글(落書)이라는 본래의 의미 그대로 낙서는 의미의 완전하고 매끈한 전달을 의도하지 않는다. 동시에 그 목적과 목적지 또한 모호하다. 그 자체로 지면 위에 머물기도 하고, 그 어떤 호소보다도 눈에 띄기도 한다. 김응수 감독의 <낙서가 박힌 정경>은 이러한 낙서의 존재 양식을 영화적 실천과 결합한 에세이 작품이다.
그를 대변하는 서사적 화자인 K가 베트남의 고산 지대로 여행을 가서 촬영한 사진과 현장에서 끄적인 낙서들이 영화의 주된 질료다. 여느 여행기 혹은 로드무비와 달리 이 영화에는 선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는다. 예컨대 그는 여행을 왔지만, 관광 명소로 나서지 않는다. 그보다는 호텔에 머물며 발코니로 보이는 풍경과 호텔방에 걸린 현지 여인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된 사고의 연쇄에 빠져든다. 그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말들, 낙서들은 껄렁하거나, 냉소적이거나, 신선한 통찰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목적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 애초에 목적지는 선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뿐이다.
길을 잃는 것은 여행이 될 수 없는가? 화자의 태도는 영화의 언어와 공명하며 더 큰 설득력을 얻는다. 영화는 선형적인 논리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직관적으로 매혹되는 순간들을 포착하고, 이어 붙인다. 이런 방식으로 풍경과 대상을 만나면 안 되냐고 되묻듯이.
감독소개
김응수는 1966년 충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다. 이후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1996), <달려라 장미>(2006), <물속의 도시>(2014), <오, 사랑>(2017), <고다르>(2023) 등 25편의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에세이 필름, 장르 없는 영화를 만들었다. 『J1:힉스. 존재의 무게』 『J2:알람브라 궁전의 석주』(써네스트, 2012), 영화제작 과정에서 만난 한 청년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픽션 『나쁜 교육』(사가, 2022) 등의 책을 썼다.
작품
1996년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극영화
2002년 욕망/극영화
2005년 달려라 장미/극영화
2006년 천상고원/극영화
2008년 과거는 낯선 나라다/다큐멘터리
2010년 물의 기원/극영화
2012년 아버지 없는 삶/다큐멘터리
2014년 물속의 도시/다큐멘터리
2016년 옥주기행/다큐멘터리
2017년 우경/극영화
2018년 오, 사랑/다큐멘터리
2018년 초현실/다큐멘터리
2018년 산나리/다큐멘터리
2019년 나르시스의 죽음/장르구분 없음
2019년 스크린 너머로/장르구분 없음
2020년 마지막 풍경/장르구분 없음
2020년 모호한 욕망의 대상/장르구분 없음
2020년 흔들리는 카메라/장르구분 없음
2021년 사각형을 위한 씻김굿/장르구분 없음
2021년 시간의 고고학/장르구분 없음
2021년 바다의 극장/장르구분 없음
2022년 생 로랑/장르구분 없음
2023년 고다르/장르구분 없음
2023년 펄프픽션/극영화
2024년 그들의 이런 만남/장르구분 없음
2025년 낙서가 박힌 정경/장르구분 없음